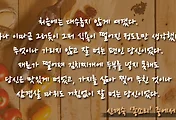중견 소설가 구효서씨가 올해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열흘 전쯤인가,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 것은 바게트였다. 어슷하게 썬 바게뜨의 보들보들한 면에 마요네즈나 겨자를 발라 이것저것 얹어 먹는 바게트 샌드위치도 좋고 그저 토스트에 구워 버터를 발라 먹는 것도 맛있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싶겠으나 구효서씨는 세상의 빵은 슈크림빵, 소보루빵, 단팥빵, 그도 아니면 고로케가 전부인 줄 알던 ‘촌닭’에게 바게트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 준 존재다. 그의 소설 <오남리 이야기> 덕분이었으니 1998년이었다. 당시에도 제과점에서 바게트를 팔았지만 난 바게트를 보면서 그것이 먹을거리라는 인지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다. 부시맨에게 떨어진 콜라병 수준이었다고나 할까.
![[푸드립]3.바게트-얹어 먹고, 발라 먹고, 구워 먹다](http://img.khan.co.kr/news/2017/01/26/l_2017012601003537900283344.jpg)
우선 소설 이야기부터 해야겠다. <오남리 이야기>는 소설이라고 하지만 아니기도 하다. 그가 남양주 오남리 보라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작가이므로 일종의 작업실로 봐야할 것 같다) 살림하고 밥 해먹고 이웃들과 지내는 소소한 이야기를 감옥에 있는 동료 소설가 김하기에게 전하는 편지 형식으로 쓴 것이다. 그 자신도, 편지인지 수필인지 소설인지 알 수 없다고 할 만큼 실존 인물과 가공의 에피소드가 뒤섞여 있다. 아무튼 이렇다 할 사건도, 감정의 파고도 없는 이 책이 한번에 휘리릭 읽힐 만큼 활기와 생동감으로 넘쳐나는 것은 매일 뭔가를 해 먹고 사는 잔잔한 삶을 맛깔 나고 감칠맛 있게 풀어내는 말투, 혹은 문체 때문인 것 같다. 그는 바게트로 한끼를 대충 때웠다고 무심하게 건넨다. 땅콩잼 쩍쩍 발라 우물우물 꿀꺽 하기도 하고 바게트를 토스터에 구운 뒤 버터를 바르고 그 위에 햄, 치즈, 오이피클을 얹은 뒤 양겨자를 발라 커피를 곁들이기도 한다. 대층 쓱쓱 아무렇게나 먹는 듯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감당할 수 없는 식욕이 밀려들었다. 사실 고백하자면 이 책을 한번에 휘리릭 읽지는 못했다. 중간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책을 덮어 놓고 빵집으로 냅다 뛰었으니까.
책표지 앞쪽 날개에 있는 구효서씨 사진은 푸근한 이웃 아저씨 인상을 풍겼다. 당시만 해도, 선망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신문물처럼 여겨지던(적어도 나에겐) 바게트를 이 ‘아저씨’도 편히 즐기시는 걸 보니 나도 먹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 같은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었다. 기름 발라 넘긴 머리를 했다거나 도트무늬 스카프라도 세련되게 소화한 사진이었다면 아마 그 정도로 욕망에 불타오르지는 않았을지 모르겠다.
![[푸드립]3.바게트-얹어 먹고, 발라 먹고, 구워 먹다](http://img.khan.co.kr/news/2017/01/26/l_2017012601003537900283347.jpg)
먹거리로서의 바게트는 내 요리 세계에 새 장을 열어 주었다. 딱히 요리라기엔 민망하지만 바게트를 응용해 이것저것 만들어서 한끼를 때우거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이 집에 왔을 때 손쉽게 만들어 내는데 이만큼 간단한 게 없다. 특히 자주 만들어 먹는 것이 마늘빵이다. 마늘 간 것 한 숟갈(밥숟가락이다), 버터 녹인 것 한 숟갈, 연유 한 숟갈, 그리고 파슬리 3분의 2숟갈 정도를 넣고 휘휘 섞어준 뒤 바게트에 발라 오븐에 5분 정도만 구우면 된다. 오븐이 없으면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도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연유’다.
![[푸드립]3.바게트-얹어 먹고, 발라 먹고, 구워 먹다](http://img.khan.co.kr/news/2017/01/26/l_2017012601003537900283345.jpg)
만능 요리로 꼽을 수 있는 것으로는 타파스가 있다. 좀 더 좁혀 말하면 핀초스. 뭐 대단한 건 아니다. 스페인에서 술에 곁들여 먹는 간단한 안주 내지는 가벼운 식사거리를 타파스라고 한다. 스페인은 각 지방색이 강하다보니 음식 역시 지역별 특색이 있는데, 핀초스는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 먹는 타파스다. 주로 바게트 위에 다양한 ‘고명’을 얹어 꼬치를 꽂은 것이다. 일종의 오픈샌드위치라고 할 수도 있다. 크래커 위에 이것저것 올려 먹는 카나페랑 비슷하게 봐도 된다. 아무튼 핀초스를 만들 때 바게트를 얇게 써는 편이 좋다. 너무 두꺼우면 하나 먹고 배불러 떨어지고 만다. 이 위에 이것저것 아무거나 올려도 된다.
어떤 후배는 “이것 저것 갖은 양념을 집어 넣어” “집에 있는 재료 아무거나로” 이런 식의 요리법 설명이 제일 화난다고 했다. 마치 전교 1등이 “이게 이해가 안돼?” 하고 쳐다보는 기분같다나 뭐라나. 그런데 이건 응용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올리면 된다. 예를 들면 이렇다.
바게트 위에 슬라이스치즈 자른 것, 고추참치 두 티스푼. 그럼 끝이다. 아니면 김치에 일반 참치를 넣고 살짝 볶는다. 우리가 흔히 해 먹는 김치볶음. 이걸 바게트 위에 올려도 된다. 매콤한 게 싫으면 일반 참치에 마요네즈를 넣고 비벼서 올리면 된다.
조금 응용할 수도 있다. 후루츠칵텔(230g 정도의 작은 것)을 체에 부어 한 10분가량 물기가 빠지게 둔다. 계란 삶은것 한 개와 마요네즈 한 숟갈, 좀 뻑뻑하다 싶으면 두 숟갈 넣어도 된다. 이것을 휘휘 섞어 올려주면 깔끔한 맛으로 즐길 수 있다. 피클 다진 것과 삶은 달걀, 맛살, 마요네즈를 섞어 올려도 물론 된다. 남은 반찬을 올릴 수도 있다. 설에 전이 남았다고 치자. 호박전은 잘게 썰어서 다시 살짝 볶는다. 산적이나 동그랑 땡도 다져서 가볍게 볶는다. 감자를 삶아 으깬 뒤 이것들을 넣는다. 여기에 스파게티용 토마토 소스나 피자 소스 중 입맛에 맞는대로 넣고 섞는다. 취향 따라 케첩이나 머스터드를 넣어도 괜찮다. 그렇게 다 섞어서 얇게 자른 바게트 위에 올리면 된다. 원조가 보자면 황당무계하기 그지 없겠지만 뭘 올리라고 정해진건 없지 않을까 싶다. 소세지, 하몽, 연어알 등 하면 할수록 스스로 보유한 레시피의 종류도 늘어날 것이다. 아, 그리고 이런 타파스류를 만들 때 빵을 굽는지 어떤지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알아서 취향대로 하시면 된다.
![[푸드립]3.바게트-얹어 먹고, 발라 먹고, 구워 먹다](http://img.khan.co.kr/news/2017/01/26/l_2017012601003537900283346.jpg)
바게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프랑스를 대표하는 빵이다. 불어로 지팡이를 뜻하는 바게트가 프랑스 혁명의 산물이라는 것은 꽤 알려진 이야기다. 혁명 전만 해도 프랑스에선 귀족이 먹는 빵과 농민이나 평민이 먹는 빵은 달랐다. 귀족은 부드러운 흰빵을 먹었지만 농민들은 도끼로 잘라야 할 만큼 딱딱한 빵을 먹었다. 하지만 혁명 이후 누구나 같은 빵을 먹을 수 있게 됐다. 말하자면 바게트는 앙시앙 레짐 해체의 상징인 셈이다. 그래서 프랑스에선 국가가 바게트의 규격과 무게까지 정했고 20세기 후반까지 이어졌다. 전통이고 상징인 빵이다 보니 소문난 바게트 장인들도 꽤 있을 터. 국내에선 장 피에르 코히에가 몇년전 블로그에 소개되면서 입소문이 났었다. 그의 가게는 개선문 근처에 있다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다.

반으로 자른 바게트 /출처 위키피디아

출처 위키피디아

다양한 타파스 /출처 위키피디아
'잡식과 탐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푸드립 5 홍합 (0) | 2017.03.08 |
|---|---|
| 푸드립 4 간장게장 (0) | 2017.03.08 |
| 푸드립 2 카스테라 (0) | 2017.03.08 |
| 푸드립 1 가지 (0) | 2017.03.08 |
| 2016 아시아 최고의 레스토랑 (0) | 2016.03.03 |